- 779년 100여명이 사망한 지진에도 불국사는 끄떡 없었다
재난의 역사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건축물인 불국사는 그 일대에 활성단층이 지나가 우리나라에서 지반이 가장 불안정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역사문헌에는 통일신라시대인 779년에 ‘땅이 흔들리고 민가가 무너져 죽은 자가 100여명이나 됐다’는 문헌상 지진 피해도 기록됐다. 그런데도 불국사가 1천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진에 견뎌오며 그 본래모습을 지켜 온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1천년의 역사 경주 불국사

울산과 경주 사이에는 여러 개의 서로 평행하는 역단층으로 이루어진 활단층이 통과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대 동안 경주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다. 경주는 조선시대에도 지진 다발지역에 해당했으며, 계기관측이 이루어진 최근의 지진 자료에서도 지진의 진앙지로 보고된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기록들과 활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쉽다는 사실을 종합할 때, 경주지역은 소규모 지진이 빈발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지진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지반이 불안정한 이 지역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국사가 입지하고 있다. 불국사의 내진구조를 조사해온 황상일 경북대 지리학 교수는 “이러한 비탈진 곳에 돌을 쌓아 건물 터로 만든 불국사 남쪽과 서쪽 기단부 석축에 여러 내진공법이 적용됐음을 확인했다”며 “8세기 신라인은 돌을 화용한 세계 수준의 내진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진 발생 빈번한 지역에 불국사 세워
불국사 석가탑의 하부구조는 그렝이법을 적용, 자연상태의 불규칙한 자연석의 표면에 맞추어 정밀하게 깎여져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진 기록은 거의 30회에 달하며 규모가 큰 지진도 확인된다. 이것이 모두 경주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경주 부근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국사 동쪽 토함산 산록에는 복수의 북-남 주향의 단층선이 항공사진과 대축척 지형도에서 확인되며, 불국사와 선원 사이를 통과하는 북동-남서 주향의 단층선은 불국사 경내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선상지 역층을 변위시키고 있으므로 활단층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찰을 설계한 사람들은 지진에 의한 재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국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절의 위치를 이곳에 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다양한 내진설계를 고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국사 건축물의 주요부가 입지한 중위면은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남쪽과 서쪽 가장자리에 석축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건축설계에서 그렝이법은 두 부재가 서로 이가 잘 맞도록 갈아내는 것으로 나무와 돌 뿐 아니라 돌과 돌, 나무와 나무를 밀착 시킬때도 쓴다. 인위적으로 확장한 구역인 이곳은 지진 하중의 충격에 대해 원지반과 같은 정도의 저항력을 갖기 어렵다. 건축에 있어서 내진건축방식은 주로 기초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현대에서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이 지진의 영향을 받으면, 가장 아랫부분이 내려앉거나 뒤틀리는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불국사에서 지진에 대한 특수 공법은 중위면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대웅전과 극락전 남쪽 석축부 그리고 중위면의 지형면 경사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웅전 서쪽과 극락전 서쪽 축대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내진구조 적용해 지진에너지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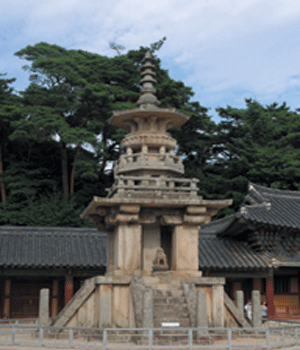 |
||
불국사에 적용된 그렝이법은 기반암 위에 쌓은 자연석과 그 위에 얹힌 인공으로 가공한 석재 사이가 단단하게 맞물려 고정되므로 하부 자연석과 상부 가공한 석재가 일체가 되어 지진의 수평하중으로 인한 변형을 막아 지진에너지를 견디는 장치이다. 아울러 반듯하게 가공한 석재의 가장 아래 부분이 하부석재들을 고정시켜 기반암으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로 인하여 자연석들이 이탈되거나 위치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연석들 사이에 약간의 유격이 있으므로 지진에너지는 이런 석재들 사이의 미세한 움직임과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소리에너지로 상당한 양이 소모된다.
그렝이법은 기반암 위에 석축이 가장 높이 조성된 대웅전 남회랑에만 적용되었다. 이것은 인공 구조물을 높게 만들어야 하므로 지진에너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구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를 짜 맞추는 것으로, 건물을 이루기 위해 수직재와 수직재, 수평재와 수평재 그리고 수직재와 사경재가 서로 얽히거나 짜여지게 되는 모든 방법이나 모양새를 말한다. 결국 목조건축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힘을 받는 기둥과 보를 못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재들이 서로 걸리게 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양식은 기본적으로 지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크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 전체가 지각운동에 따라 흔들리지만, 지진이 끝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탄성이 있는 목재들이 서로 단단히 결구되어 있으므로, 지진에 의한 흔들림에도 파괴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불국사의 석축은 목재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목조건축 양식인 결구법을 응용하여 조성했다. 고대에는 벽돌이나 시멘트 불록으로 중요한 건물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축대는 조적조(組積造)와 유사하게 직육면체의 석재를 쌓아서 만든다.
이와 같이 양식으로 축대를 쌓는다면 단기간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수평하중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은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국사를 설계한 이들은 인공 기초인 축대를 만드는데 석재로 목조건축의 양식을 적용했다. 이것은 목재가 가진 높은 진동저항계수는 없으나, 목조건축양식이 가진 내진기능을 응용한 것이다.
강력한 내진구조인 유공초석으로 마무리
또한 불국사는 못대가리처럼 머리 안쪽에 잘숙한 홈을 파서 상하의 돌기둥과 좌우의 수장재를 걸어서 인공적으로 가공한 석재인 주두석(동틀돌, 첨차석)을 이용해 석축의 원래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두석은 결구의 핵심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머리부분만 외부에 드러나고 나모지는 석축의 안쪽으로 깊숙이 박혀있어 앞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주두석의 머리 부분에 홈을 파서 이것을 중심으로 반듯하게 다듬어 석재들이 서로 맞물리도록 했다.
 |
불국사의 대웅전 남쪽 기단부 청운교 좌우, 극락전 남 및 서회랑, 대웅전 서회랑 석축에 주두석 등을 이용해 기단부를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초석에 구멍을 뚫은 유공초석은 앞서 말한 그렝이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진구조이다. 지진에너지의 대부분이 수평하중인 것을 감안하여 건물의 기단부와 기둥을 일체화시켜 지반이 움직일때 함께 움직이도록 하여 기둥이 초석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며 건축물의 변형을 막고 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은 목조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진기능으로 흡수하도록 하였다.
대웅전 서회랑에서 초석에 구멍을 뚫은 유공초석이 발견 되는데, 이것은 방형초석(方形礎石)의 가운데 부분에 원형으로 지름 15~20cm 구멍을 관통시켰으며 초석의 규모로 볼 때 나무기둥 지름은 45~60cm정도이다.
아름다움으로 본모습 지키는 불국사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교의 교리적 상징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불국사가 아무리 훌륭한 상징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받혀주는 형식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불국사는 그러한 형식을 1,200년 동안이나 지켜오며 당당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불국사가 완공되기 까지는 이 지역이 가지는 자연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생된 건축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아마도 당시로서 동원 가능한 모든 내진공법을 연구하여 설계도를 완성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렸으며, 내진공법의 요체가 되는 석축을 완성하는데 역시 오랜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복잡하고 세밀한 내진 구조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석축안에 감추면서 미학적으로 절정에 다다르는 불국사는 1250년 전 신라인들의 기술 수준을 짐작케 한다. 구성 부분들이 각각 특별한 역할을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불국사는 과학에 근거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
지진의 위험이 매우 높은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내진구조가 함께 적용된 고대의 석조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구조의 내진 기능의 우수함은 불국사 중창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목조 건물은 여러 차례 다시 짓거나 보수하였으나, 석축 부분은 거의 보수하지 않고 창건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기교에만 치우쳐 지나치게 치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불국사의 진정한 미는 과학에 근거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일이다.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